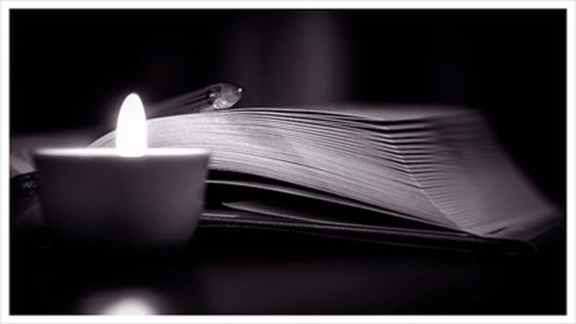새벽에 변기를 붙잡고 어제 먹은 음식물을 확인하며 “아, 너였구나.” 인사하고,
나머지 것들은 설사라는 이름으로 봇물 터지듯이 쫙쫙 빼주었다.
모든 기력을 다 쏟은 후에 이부자리 속으로 몸을 쏙 집어넣으니,
이번엔 신랑이 달고 들어온 감기바이러스가 기력이 쇠한 틈을 타서 몸 안으로 쏙 들어왔다.
아, 이 모든 것은 예식장에서 폭풍 흡입한 음식물 때문이었으리라.
감기를 달고 사는 두 아이와 집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
눈앞에 펼쳐진 산해진미에 잠시 정신을 잃었나 보다.
겨울잠을 자는 곰도 아니면서 지금이 아니면 양분을 흡수할 수 없다는 갈급한 사명감에
입으로 꾸역꾸역 넣었고, 두 아들 입으로도 부지런히 음식을 날랐다.
식탁에서 혼자 전쟁을 치르며 밥을 먹이다 보니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았다.
아, 신경쇠약도 한몫했으리라.
몸살 기운에 위장은 꼬여있고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었다.
첫째 아이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하는데 걸을 힘이 없어 그냥 못 보냈다.
그래도 밥은 새 밥 먹인다고 새벽부터 쌀 씻고, 애들 먹기 편하라고 감자와 두부로 잘게 썰어서 멸칫국물로 된장국도 끓였다. 혹여나 입맛 없을까봐 친정엄마가 준 조기 두 마리를 맛깔스럽게 구웠다. 구운 뒤에는 가시도 다 발라내어 새 밥 위에 올려놓았다.
눈을 비비고 일어난 두 녀석에게 두툼한 옷과 양말, 목수건까지 해놓고는 식탁 의자에 앉혀서 밥을 먹였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아이들에게 이래도 달래고 저래도 달래면서 간신히 입안으로 밀어 넣고는 내 밥을 먹었다. 뚝배기에 밥을 두 숟가락 넣고는 끊인 흰죽이다.
입안에 털어 넣으니 모래를 씹는 기분이다.
“엄마 놀아줘.”
“엄마 밥 조금만 더 먹고 놀아줄게.”
첫째가 식탁 의자를 붙잡고 나를 조르는 사이에, 돌 지난 둘째는 책장을 붙잡고 눈알에 힘을 주며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철퍼덕 궁둥이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안---돼!”
식탁에서 날리다시피 몸을 던지고는 둘째의 몸통을 잡았다. 역시……. 청국장 냄새가 기저귀에서 솔솔 났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이에 첫째는 가위를 들고 색종이 자르기를 한다면서 여기서 싹둑 저기서 싹둑. 5분 만에 “아, 재미없다!”하고는 미니 자동차를 전부 끄집어내고는 주차장 놀이를 한다. “재미없다. 집 만들어야지.” 옷장에서 이불을 줄줄이 꺼내고는 동그랗게 만든다. 베개도 죄다 꺼내서 문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난리다. 거기에 둘째도 이불과 얽혀서 집이 되어 간다.
‘아, 지금이다.’
이 틈에 식탁에 음식을 다 정리하고는 설거지를 한다. “으앙~” 울음소리에 급하게 거실을 보니 첫째가 둘째 얼굴을 엉덩이로 밟고 있다. ‘야! 이 녀석아!”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천사의 음성으로 “형아가 그러면 동생이 아파. 그러지 마.” 하며 둘을 간신히 떼어 놓았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둘째는 내 옆에 잠시 두었더니 이 녀석이 싱크대를 뒤지기 시작한다. 서랍을 열어서 호일을 카펫처럼 죽- 펼치고는 손으로 구깃구깃, 비닐장갑을 쪽쪽 팔다가 퉤 뱉어 버리고, 고무장갑을 꺼내서 냄비 안에 넣고, 컵은 양념 칸 위에 던져 버리고……. 설거지 한 손으로 간신히 몸통을 붙잡고 안방에 놓으니 이젠 물티슈 뚜껑을 열고는 휴지 빼기 묘기를 선보인다. 둘째를 아기 이불에 돌돌 말아 김밥으로 만든 후 내 발 옆에 놓고 급하게 설거지를 끝냈다. 거실로 눈을 돌리니 우리 집? 거지소굴? 아닐거야... 아닐거야... 이노무 첫째...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첫째에게 나와 함께 청소놀이를 해보지 않겠느냐며 아이의 마음을 돌린 뒤에 이불을 개고 색종이 줍기 게임을 했다. 그 와중에 둘째는 색종이를 보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입 넣으면 내가 다시 퉤, 다시 한 입 넣으면 내가 다시 퉤 하게 했다. 그러니 첫째가 우하하하 웃고는 자기도 아기 흉내를 낸다.
잠시 한숨을 돌리니 점심시간이다.
‘뭘 했다고 벌써 점심시간이냐?’ 식탁 의자에 앉아서 쉬니 몸이 저린 것이 느껴졌다. ‘아, 그렇지 나는 지금 무척 아픈 상태지.’ 새삼 내 몸 상태가 떠올랐다. 내 뒤로 두 아들은 또 싸우고 있었다.
‘그렇지. 저 녀석들 내가 말리러 가야지. 내가 아니면 또 누가 말리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밥을 먹이고 입을 닦아주겠어. 내가 옆에서 살뜰하게 놀아주지는 못해도 내가 아니면 누가 같이 그림 그려주고 노래도 불러 주겠어. 내가 해야지. 내가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누가 이 애들 돌보겠어? 참, 내가 아파도 아플 틈이 없네. 아픈 것도 아플 시간이 있어야 아플 수 있는 거구나. 아플 수 있는 것도 복이네. 아니지. 아파도 아플 시간이 없으니 병이 낫는 거 아닌가? 그럼 더 좋은 건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
예전 같으면 이불 속에 누워서 앓는 소리 하며 지냈을 텐데,
엄마가 되니 어디서 이런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앓으면서도 그냥 잊어버린 병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런가 보다.
아파도 아플 수 없는 사명감이 아픔조차도 잊게 하는 모양이다.
- 조회수
- 17,448
- 좋아요
- 0
- 댓글
- 54
- 날짜
- 29/12/2014